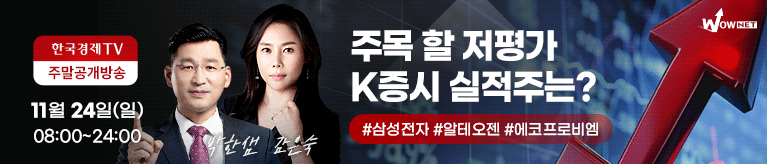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연합시론] 코로나 위기속 주목받는 현대차 노사의 사회적 선언
(서울=연합뉴스) 국내 대표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21일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동결에 잠정 합의했다. 아직 전체 조합원의 추인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대차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통상 3∼8개월 걸리던 협상 기간도 이번엔 40일로 매우 짧았다고 한다. 노사가 속전속결로 임금 동결에 공감한 것은 현대차가 처한 위기의 실상을 반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극심한 글로벌 소비 침체로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24%, 매출은 7.4%,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각각 곤두박질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했던 2분기의 경우 영업이익은 반토막났다. 이런 실적 악화 속에서 노조가 기존의 투쟁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임금 동결 자체를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이 실적을 올려 이익을 낸다면 그 과실을 노동자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회사 존립을 위해 노동자들도 임금 요구를 자제해야 마땅하다. 현대차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합의에 도달한 것은 갈등 조정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차 노사 합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임금 협상 결과보다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이다. 노사는 선언문에 국내 공장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 자동차 산업의 변화 대응과 산업 변화에 대비한 직무 전환 프로그램 운영, 품질 향상,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부품 협력사 상생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미래 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 안정,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협력사와의 상생에 노사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노조로서는 임금 인상이라는 눈앞의 이익 대신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가 주도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전환기적 카오스에 직면해 있다. 도도한 변혁의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자동차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부품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여기에 생산라인의 무인화와 자동화는 가속하고 있다. 갈수록 고용의 불안정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무너지면서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매출 절벽으로 한계에 몰리는 기업이 증가하고 해고가 일상화하고 있다.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5만명을 거느린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과거 강성 노조, '뻥 파업'의 대명사였던 현대차 노조의 선택은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자동차 업체의 노사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계에 만연한 경직되고 대립적인 노사문화가 협력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민주노총이 빠지기는 했지만 지난 7월 말 나온 노사 고통 분담과 상생 노력을 담은 노사정 협약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어느 기업이든 위기를 노사 일방의 독주와 독선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서로 배려하는 양보와 타협, 미래에 대비하는 열린 사고만이 생존과 혁신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