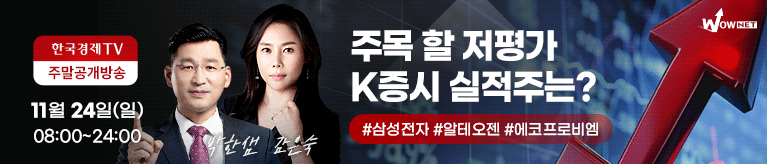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23일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56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7년생(56세)은 28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고, 1968~1983년생(40~55세)은 20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주는 조건이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23일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56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7년생(56세)은 28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고, 1968~1983년생(40~55세)은 20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주는 조건이었다.하지만 희망퇴직 신청자는 작년보다 100명 이상 줄어 400명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와 비교해 56세(28개월치 월평균 급여)는 희망퇴직 조건이 같지만 40~55세(20~39개월 치 월평균 급여)는 나빠졌기 때문이다. 작년 493명이 회사를 떠난 농협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가 300여 명에 그칠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다음달 말께 희망퇴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작년 1967~1972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율이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조건이 나쁠 경우 노조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967~1980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 우리은행 역시 인력 구조상 올해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35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억5500만원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은행권은 판매관리비 절감과 신규 채용을 위해서라도 희망퇴직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은행의 영업점 수가 2018년 4699곳에서 지난해 3989곳으로 4년 새 700개 넘게 줄어든 점도 이유로 꼽힌다. 희망퇴직 없이는 신규 채용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 1500여 명, 하반기 1000여 명 등 총 2500여 명을 새로 채용했다. 작년 희망퇴직자 수(2357명)와 비슷한 규모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