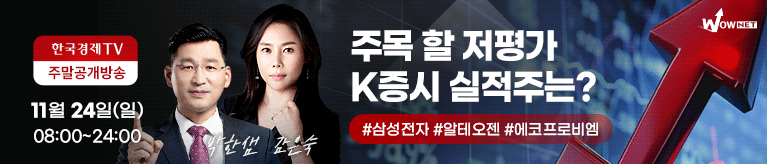사회초년생 A씨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2016년 7월 호기롭게 화장품 소매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먼저 B씨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샀다.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460만원을 들여 서울 중구의 한 건물도 임차했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지 한달 만에 장사를 접고, B씨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구입했던 화장품을 1억2000여만원에 그에게 되팔기로 했다. 또 상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합쳐 2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다.
즉, B씨가 A씨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사업장을 양수하는 것이 합의의 큰 틀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다. B씨는 A씨에게 9000만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나머지 영업양도 대금과 화장품 대금 등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의 합의서를 살펴보면, B씨는 A씨로부터 수령한 화장품 물품대금 1억8000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을 2016년 11월까지 환불하기로 했다(계약서 제1조). 그런데 B씨가 제3자인 C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채권 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뒤, A씨가 B씨한테 화장품을 인도한다는 조항(2조)도 있다.
A씨는 합의서 1조에 근거해 B씨에게 화장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합의서 2조를 바탕으로 “C씨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한 돈으로 먼저 (물품 대금을) 충당하고, 이후에도 남은 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화장품 대금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공방도 발생했다. B씨는 임대차보증금 등은 화장품 대금 지급완료를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건데, 아직 화장품 대금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임대차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자신의 의무인 화장품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이행기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영업양도대금 및 화장품 대금 2억6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기본적으로 합의서 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상충되는 듯한 내용의 조항들도 존재해, 합의서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원고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합의서 문구가 일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서, 소송 중 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2년 이상 다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양수도 계약 합의는 단순 물건 매매 계약과 달라 임직원과 영업비밀, 기술 등 인적 리스크와 물품, 장비, 우발 채무 등 물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와 가능성이 얼마든 변할 수 있다”며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할수록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