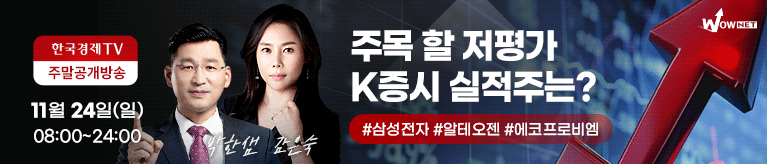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중·후반 한국 대표 부촌(富村)이었다. 1999년 3억4200만원에 분양한 전용 84㎡짜리는 2006년 14억8000만원에 실거래돼 가격 정점을 찍었다. 놀라운 건 84㎡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6년 판 집주인들이 10억원 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냈다는 점이다.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세)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때리는 요즘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중·후반 한국 대표 부촌(富村)이었다. 1999년 3억4200만원에 분양한 전용 84㎡짜리는 2006년 14억8000만원에 실거래돼 가격 정점을 찍었다. 놀라운 건 84㎡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6년 판 집주인들이 10억원 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냈다는 점이다.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세)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때리는 요즘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이런 파격적 양도세 면제혜택은 1998년 2월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덕에 가능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가액 6억원 이하, 전용 165㎡ 이하’ 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법을 그해 시행한 것이다. 2001년 5월~2003년 6월에 산 집이 대상이었던 만큼 2002~2004년에 순차적으로 입주한 이 아파트 집주인 상당수가 혜택을 봤다.
이 사례는 호황기냐 불경기냐, 보수정부냐 진보정부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던 양도세의 운명을 잘 보여준다. 1960년대 본격 경제개발에 나서면서 땅값이 급등하자 1967년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던 게 양도세다. 이후 불황기에는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확대, 활황기에는 그 반대 방법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2000년대 이후만 보면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체로 양도세 부담을 줄였고,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강화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양도세 완화가 ‘핫이슈’로 떠올라 주목된다. 이번엔 과거와 달리 양도세가 부동산 과열기에 집값 안정 수단으로 거론돼 눈길을 끈다. “매매를 기피할 정도로 과도한 양도세율을 낮춰야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검토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 양도세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했다.
어느 쪽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전통적 경기부양 수단인 ‘양도세 완화’가 지금은 부동산 과열을 식힐 카드로 언급될 만큼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참에 정부가 야당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 경제·민생만큼은 협치를 하고, 집값도 안정시킨다면 누가 뭐라겠나.
송종현 논설위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