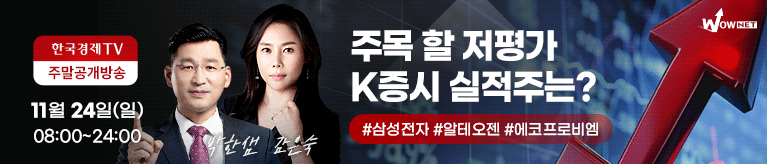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가장 먼저 정착된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당들이 정치를 주도해온 영향이 컸다. 최근에는 EU가 글로벌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ESG를 활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 사례가 ESG 공시 의무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은행·보험·연기금·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고객 자금을 굴리는 모든 회사가 대상이다.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역외 금융사도 해당된다. EU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한 국내 금융사도 적용 대상이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의 역내 기업에 ESG 관련 정보와 ESG 리스크 대응방안 공시를 의무화했다. 최근엔 ESG를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금융분류체계’ 기준을 정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ESG 공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활동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분류체계엔 투자활동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인종·성차별 여부,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 등이 망라돼 있다. 핵심은 ‘E’(환경)이다. EU는 ESG 투자와 관련해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통제 △생태계 보호·복원 등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EU의 ESG 행보가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남미와 아시아 신흥국들이 EU의 녹색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겉으로는 ESG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시장 접근을 차단하려는 이른바 ‘신보호주의’라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뉴스